대부분의 신문 칼럼이나 논문을 보면 대부분 인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된다. 칼럼은 죄다 인용이며, 논문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논문 맨 끝을 보면 인용한 논문이나 책의 리스트가 나온다. 엄청 많다. 논문도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 분량을 뽑아 낼 수 없다. 대부분 남의 어쩌구 저쩌구 하다가 그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의견은 이렇다는 식의 결론을 낸다. 이게 논문의 실체다. 글이라고 다를 바 없다. 대부분의 글은 인용을 통해 쓰여지고 인용으로 빛을 본다.
초창기 작가 시절 나도 그랬다. 책을 읽으며 인용된 수많은 글들을 보며 이런 글들은 어디서 인용한 걸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도대체 작가들은 이런 멋진 인용 구절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모 그런 고민이었다. 하지만 쓰다보니 알았다.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있지만 정작 대부분은 쓰는 시점에 이리 저리 찾아본다. 찾다보면 꽤 괜찮은 인용거리가 나온다. 그걸 적시적소에 잘 인용하면 된다. 이 실력이 뛰어나야 훌륭한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못하면 작가는 포기해야 한다.
글쓰기 참 좋은 세상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는 지천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검색력을 바탕으로 얻어낸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그럴듯하고 재해석하거나 인용하면 그걸로 멋진 글의 토대가 구축된다. 남정욱 교수는 2019년 조선일보에 ‘글쓰기 달인 셰익스피어, 다산을 한번 봐... 글쓰기의 최상은 잘~ 베끼는 것이야’란 칼럼을 썼다. 이 칼럼은 인용에 대해 적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같이 들여다 보자.
) -->
인용으로 시작해 인용으로 끝나는 글을 싫어한다. 인용의 거대한 무덤 같은 글을 보면 숨이 막힌다. 저절로 인용이 될 것이기에 가능하면 읽지 않으려 애썼고 읽더라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끄트머리엔 술을 마셨다. (중략)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반드시 있다는, 오로지 내 통찰만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이 쓴 글이다. 지금은 이런 무식한 생각을 절대 안 한다.
) -->
이 글을 보면 남정욱 교수도 인용 일색인 글에 숨막혀 했으며 심지억 기억하기 싫어 술까지 마셨다고 이야기한다. 남의 글이 아닌 자신의 글로 세상을 표현하려 했다. 그리고는 지금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 나도 그랬다. 이왕이면 내 생각을 적어야지 남의 이야기를 백 날 해서 무엇하랴, 그것은 이미 발표된 글이고 세상에 떠돌아 다니는 글이 아닌가? 그런 글을 내가 재탕, 삼탕해서 얻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도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글쟁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남교수와 마찬가지로 그건 큰 오류란 걸 깨달았다. 우선 내 생각만으로 글을 쓰면 1) 재미가 없고, 2) 분량을 채울 수도 없으며, 3) 신빙성이 떨어지는 푸념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남교수의 다음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자.
) -->
현재의 소생이 생각하는 글쓰기의 최상은 독창이 아니라 잘 베끼는 것이다. 독창을 추구했더니 독과 창으로 돌아와 욕창이 생기도록 고생한 끝에 얻은 소중한 결과물이다.
) -->
'영업 비밀'을 하나 털어놓자면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일단 블로그와 카페를 검색한다. 열 개 정도면 청탁받은 소재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잡힌다. 소생이 하는 일은 이걸 죄 퍼온 다음에 중복과 근거 희박을 걷어내고 인물이나 사건 하나를 주인공 삼아 흐름을 재배치한 후 내 말투로 바꾸는 것이다. 딱 그게 전부로 짧으면 한나절, 길어야 사흘이다.
) -->
내가 남정욱 교수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창을 추구했더니 독과 창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매우 재치가 있다. 언어유희다. 맞는 말이다. 독창을 추구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된다. 본래 해아래 새것은 없는 법이다. 다 어디서 있던 것을 가져다 쓴 것이다. 가까이 있는 것이냐 멀리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는다.
남교수는 칼럼쓰기의 비밀까지 밝힌다. 일단 자료를 열심히 찾고 거기서 근거희박과 중복만 걷어 낸 후,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재배치한 후 본인 만의 말투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게 말처럼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작업이 타인의 작품이나 성과물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 쓰이는 방식은 결국 인용이다. 인용할 문장을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고, 내 글에 녹아내느냐가 결정적인 문제란 말이다. 이 작업이 어렵다. 남교수의 다음 말을 들어보자.
) -->
베끼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었노라. 베껴 적은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그 열 배의 시간을 썼으며, 베낀 것 중 모르는 단어를 알기 위해 또 그만큼을 썼다. 이런 경로로 베끼고 나니 그 베낀 것이 베낀 것인지 애초부터 내가 생각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 -->
나는 이 문장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결국 베끼기위한 작업도 작가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 중에 그건 이미 원전의 상태가 아닌 나만의 글이 되어 버렸다. 내 글이다. 남의 글이 아니다. 따라서 마치 소설 구운몽처럼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구분이되지 않는 물아일체의 지경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 <책쓰기가 만만해지는 과학자 책쓰기 中>(김욱 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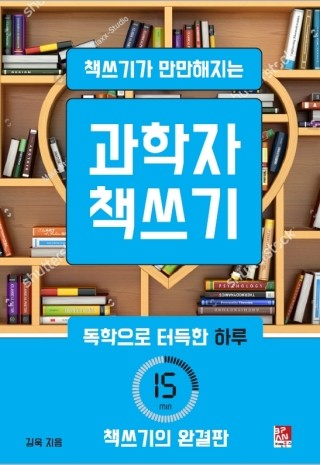
'글쓰기 실마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개의 눈 (0) | 2020.03.17 |
|---|---|
| 밋밋하게 쓰지 말고 강하게 쓰자 (0) | 2020.03.17 |
| 프리라이팅 기법 (0) | 2020.03.17 |
| 반대로 생각하기 (0) | 2020.03.17 |
|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의 핵심 (0) | 2020.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