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의 미 중 여백의 미란게 있다.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공간 자체에서 발산하는 미를 중시하는 미적 사조이다. 글쓰기에도 여백의 미가 있다. 이건 작가의 덕목이다. 글을 쓸 때 말을 다 해서는 안 된다. 독자를 위한 몫을 남겨놔야 한다. 이건 독자가 알아서 해석할 몫이다. 우리는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다. 글을 쓸 때 항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독자가 백지 상태라고, 아주 쉽게 써야 한다고 모든 책 쓰기 책에서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건 결이 다른 이야기다.
나 역시 글을 쓸 때 항상 ‘이걸 다 설명해야 하나? 이걸 다 써야 하나?’하는 고민을 항상 한다. 독자를 위한 여백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읽고 나름 고민한 결과인데, 쓰다보면 이 말이 자꾸 떠오른다. 나 혼자 이야기하면 독백이지만, 독자와 함께 하면 호흡이 된다. 그래서 독자와 호흡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100%를 다 말하지 말고 80% 정도만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집필해야 한다. 다 말하려고 하다가는 내용도 밋밋해지고 글 자체도 질척거릴 수 있다.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의 즐거움>에서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와 ‘쓰기 텍스트’로 구분한다. 읽기 텍스트는 독자가 읽게 만든 텍스트다. 독자가 인쇄된 내용을 읽으면 그 자체로 목적 달성이다. 쓰기 텍스트는 정 반대다. 독자의 몫이 있다. 독자가 직접 쓰도록 유도하는 책이다. 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제공하는 그런 책을 말한다. 이 둘은 독자 참여도 유무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그는 읽기 텍스트와 쓰기 텍스트가 적절히 어우러져야 살아있는 글이라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롤랑 바르트는 ‘글을 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새싹을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독자가 텍스트의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이란 게 작가가 쓰는 것이므로, 이 말은 작가가 독자의 참여를 배려해야 하고 독자는 작가가 펼친 독자의 공간에서 마음껏 사유하라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럼 독자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낼까?
첫째, ‘질문’이다. 독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 독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본능적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유의할 건 절대로 답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독자를 참여시키려면 질문만으로 끝나야 한다. 단, 예측은 가능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게 핵심이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독자에게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등으로 질문을 던지면 된다.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독자가 더 고민하게 된다.
둘째, ‘결론을 내지 않기’다.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해결책은 독자의 몫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선택지를 제공하고 선택은 독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거다.
셋째, 제안한다. 독자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답은 이 외에도 많이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도 찾아보길 바란다고 한다. 정답은 없는 법이라는 첨언을 해도 좋다.
넷째는 ‘여운’이다. 글 막미에 진한 여운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한다. 그 여운의 힘에 의해 독자는 생각을 한다.
다섯째, 게슴츠레 설명한다. 독자에게 지나친 설명을 삼가고, 어렴풋이 설명한다. 과잉친절은 간섭일 뿐이다. 설명하려 하면 구차해진다. 판단은 순전히 독자 여러분의 몫이다. 독자는 결코 무식하지 않으며 모르는 건 바로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여섯째, 예시들기다. 독자가 경험해 봄직한 사례를 예시로 드는 거다. 이런 사례에 독자는 감정이입이 된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그래, 그 때 그랬었지’하는 공감을 이끌어낸다. 그러면 자기 처지와 작가의 예시를 비교하며 입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솔직, 정직, 투명이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 판단은 순전히 독자의 몫이다.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다. 본래 ‘믿어달라’고 할 때는 ‘믿어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감이 없다. 솔직, 정직, 투명하게 쓰면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믿게 되어 있고,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게 되어 있다.
아는 것을 다 쓰지 말자. 독자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자. 나 역시 글을 쓸 때 쓸 거리가 5개가 있으면 정작 활용하는 건 2,3가지다. 나머지는 내 블로그에 고이 모셔둔다. 나중에 검색해서 써먹을 수 있어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하면 글이 질척거리고 중언부언, 중복, 재미없음으로 인해 원 취지를 훼손하게 되고 초점을 잃게 마련이다.
글의 절제는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절제미를 느끼게 한다. 작가의 아우라를 느끼게 한다. 이런 글은 여백의 미가 있다. 여백의 미는 순백의 미다. 독자는 여백을 읽는다. 여백이란 공간 속에서 행간을 읽는 재미를 맛본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조리 해버리면 독자가 침투할 공간이란 없다. 한두개만 넌지시 던지고 나머지는 찾아보라는 숨바꼭질 노리를 서로 즐기면 책을 쓰는 혹은 읽는 즐거움 속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 손해란 없다. 쓸 말을 모두 쓸어담지 않더라도 독자는 안다. 심연 깊숙한 곳에서 작가의 여유를 느낀다. 그리고 작가의 깊이를 공감한다. 마구 배설하듯이 쏟아 내면 독자는 느낀다. 글쓰는 사람의 깊이가 없다는 것과 내공이 약하다는 것을.
어쩌면 작가와 독자는 전생에 부부였는지도 모른다.
- <책쓰기가 만만해지는 과학자 책쓰기> 中에서. (김욱 작가 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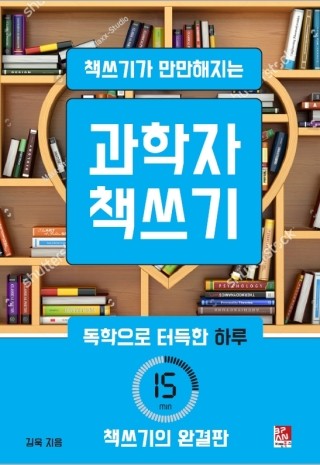
'글쓰기 실마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면 저 넘어 (0) | 2020.03.18 |
|---|---|
|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그리고 글쓰기 (0) | 2020.03.18 |
| 독자를 책에 참여시키는 방법 (0) | 2020.03.17 |
| 반대로 생각하기 (0) | 2020.03.17 |
| 표절 관련 우리의 자세는? (0)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