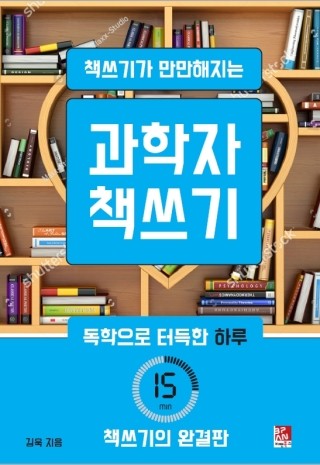스토리텔링 방식이 좋은 이유
나도 이게 잘 안 된다. '스토리텔링 식'으로 쓰려고 해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그래서 진즉부터 이용하는 게 '인용' 방식이다. 다른 책을 읽거나 기사를 보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용문구를 열심히 찾고 책에 반영한다. 인용은 다른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나름 책을 빛내주는 역할을 한다. 공신력도 높아진다. 스토리가 없는 데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고 묻는다면 나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만큼 사회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상황에 닥쳐 본 사람만이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다.
얼마 전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를 다시 읽었다. 나는 김미경 작가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열정 때문이다. 그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에서 최선을 찾는다. 나는 그런 정신이 너무도 좋다. 그녀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뭍어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녀의 책이 재미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생생한 그녀의 강의 경험이 그 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서다. 스토리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 책이 과연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물론 스토리텔링으로 적을 수 없는 책도 있다. 이런 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왠간한 단행본을 쓰려면 한 꼭지에 한 스토리텔링은 있어야 한다. 만약 넣기 힘들다면 인용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술술 읽힌다.
본래 인간은 스토리를 좋아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 화로 곁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이야기를 동경한 것도, 그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백날 한 들 누구하나 들어줄리 만무하며, 관심도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 스토리에 갈등, 교훈, 사랑이 골고루 뭍어나면 더욱 좋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도 좋다. 간혹 ‘그래 나로 저런 경험이 있지’하는 생각을 한다면 대성공이다. 여기서 핵심은 공감이다. 이처럼 이야기를 통해 글을 풀어나가면 글의 분량도 채울 수 있을 뿐만아니라 내용도 재밌어진다.
<한승원의 글쓰기 교실>에서 한승원 작가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글은 죽은 글’이라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작가라면 누구도 쓸 수 없는 글을 써야 한다. 아무나 쓰는 글은 밋밋해서 읽기 식상하며 독자의 인내심을 테스트한다. 가뜩이나 책을 읽지 않는 환경에서 이런 글을 써버리면 그나마 있던 독자들도 책의 세계에서 떠나버린다. 여러모로 민폐다. 따라서 이야기가 있는 재미난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재미로 쓰는 건 아니지만 전달력을 높이고 독자의 집중력, 책에 대한 관심도를 잡아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
그럼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된다. 주변에 스토리가 없다면 인생을 매우 무미건조하게 산 것이다. 관련 여러 모임도 가지고 활동도 해야 한다. 그래야 거기서 스토리가 나온다. 산에만 있고 집에만 있으면 스토리가 나오기 힘들다.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켜야 한다. 최근 가장 재미있게 보는 티비 프로그램이 <고독한 미식가>시리즈다. 일본 방송인데, 한 키가 큰 세일즈맨이 출장을 다니며 방문한 동네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다. 맛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그냥 배만 채우고 스쳐 지나갈 일도 여기 주인공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먹을 것을 대한다. 이 방송을 보면 나도 먹고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고 음식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한다. 맛집 기행을 하려해도 이처럼 전국을 돌아다녀야 한다. 집 앞의 식당만 다닌다면 거기서 무슨 음식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소소할수록 좋다. 서민적일수록 좋다. 무슨 거창한 소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소재를 소설의 소재로, 우리는 소설가나 시인처럼 특출난 재능이 필요없다. 단행본을 쓰기 위한 재능은 크게 필요없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슨 영감이 오고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문학적 재능은 많지도 않을뿐더러 타고나는 거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주변 소재를 찾으면 된다. 누구나 스토리는 있다. 없다고? 그러면 만들어보라. 자꾸 주위와 부딪쳐보면 그런 스토리는 나오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되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취적이고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된다.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자기 이야기다. 소재를 가까운 데부터 찾자. 내 이야기는 매일 일상에서 겪는 인생의 재미 혹은 의미를 찾는데서 시작한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적절히 글의 주제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방식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나와 연관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작게 혹은 크게 모든 일이 나와 연관이 있다. 거기서 에피소드를 찾으면 된다. 만일 여기서 찾을 수 없다면 남의 이야기를 가져오면 된다. 옆집 개똥이가 어쨌데더라, 풍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다. 특히 잘되었다더라보다 망했다더라 식의 이야기는 더욱 좋다. 우리 인간은 남의 잘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심리가 있다.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다.
딱히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고사성어, 우화, 신화 등의 소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어제 본 드라마나 책의 소재를 이야기거리로 삼아도 좋다. 주변에 모든 것이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된다.
- <책쓰기가 만만해지는 과학자 책쓰기>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