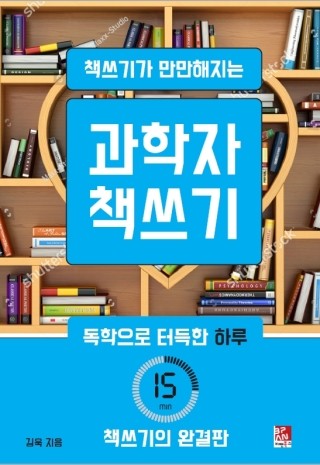목차를 작성하는 법
나는 책을 처음 쓰는 사람에게 목차만 잘 잡으면 책은 거진 쓴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지만 초보 작가들이 너무 목차잡기에 인색한 거 같아서 일부로 그렇게 강조한다. 사실 목차 잡기는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출간 된 책의 목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따라하면 된다. 목차 역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여실히 증명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정작 따라해보라고 해도 쉽게 따라하지 못한다. 그만큼 목차잡기는 어렵다. 목차를 잡는 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만드는 일이다. 기획력이 필요하다. 이런 기획력은 쉽게 습득할 수도 없으며 타고난 천부적인 재능 가지고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 따라서 목차 잡는 법은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직접 부딪쳐서 느껴보며 배우는 수밖에 없다.
어떤 책을 쓰느냐에 따라 목차잡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가령 수필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수필은 목차가 그나마 덜 중요한 영역이다. 수필집도 주제는 있을 것이므로 큰 주제만 정해놓고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써가다보면 수십개의 꼭지가 완성이 된다. 완성된 꼭지를 그룹핑해서 대목차를 만들던지 아니면 목차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방법도 있다. 오히려 이런 수필은 목차를 먼저 잡는 방식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도 있다. 써놓고 그룹핑 하는게 훨씬 더 편하다. 나는 자기계발서도 이런 방식을 이용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 30대 대표 청년작가라는 이상민 작가의 <책쓰기의 정석>을 보면 목차가 따로 없다. 단지 36개의 꼭지를 순서만 배치해서 책으로 출간했다. 이렇게 목차구성 없이 36개의 이야기로 책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대부분의 책은 대목차 4개~8개, 대목차 밑에 소목차(흔히 ‘꼭지’라고 부름)를 7~8개 넣는 방식이 대다수를 이룬다. 출판사에서도 당연히 이런 방식의 원고를 원한다. 무난한 것이 가장 좋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목차는 책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여러 책을 참고해가면서 대략적인 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책쓰기를 시작할 때 목차를 먼저 잡고 글쓰기에 들어갔으며, 목차를 잡기 위해 다양한 책을 참고했다. 가장 무난하고 괜찮다는 목차를 골라 거의 따라했다. 이렇게 하면 참신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전하다. 무난하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출간한 베테랑이 아니라면 안전하고 무난한 길을 택하기를 권한다.
목차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책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가령 ‘현상 – 문제점 – 해결방안 – 기대효과’와 같이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론 – 본론 – 결론, 기승전결, 발단 – 전개 – 위기 – 절정 – 결말은 목차를 구성하는 기본 뼈대가 된다. 글에도 구성이 필요하듯 책에도 똑같이 구성이 필요하다. 큰 뼈대를 잡고 나면 뼈대에 몇 개의 사항에 추가하여 목차를 몇 개 더 만든다. 가령 서론 – 본론 – 결론의 목차를 짠다고 하면, 본론의 내용이 아무래도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여러개로 쪼개는 거다. 서론과 결론이 한 목차를 차지하고, 본론은 3개나 4개로 쪼개면 총 대여섯개의 대목차가 탄생한다. 여기에 소목차(꼭지)를 7~8개 배치하면 목차의 틀은 완성된다. 꼭지는 이야기의 최소 단위다. 나는 대목차를 작성한 후 꼭지는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쳐 넣는다. 이 때 브레인 스토밍을 이용한다. 관련된 단어를 모두 연상시키며 연상되는 단어를 모조리 적어넣는다. 그렇게 해서 세부 꼭지명을 완성해 나간다. 이 작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몇 번 하다보면 내 머릿속에서 나올 내용은 전부 반영된다. 이렇게 목차를 완성하면 된다.
목차 완성 후에는 할 일이 있다. 같은 주제의 책을 찾아서 목차를 비교해보는 거다. 이렇게 목차를 비교해보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지 잘 알 수 있다. 빠진 부분 중 채워넣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채워넣도록 한다. 가령 나처럼 책 쓰기 책을 쓴다고 하면 세부꼭지까지 모두 작성해 놓고 기존의 책 쓰기 책과 비교하면서 빠진 내용을 찾는 거다. 보면 안다. 빠진 내용 중 내가 가져와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이런 작업을 통해 목차는 보다 완성형으로 접근해 간다. 많은 책을 참고할수록 책의 내용은 풍부해진다. 유의할 것은 생각해서 일단 먼저 목차를 작성하고, 타 책을 참고하는 건 나중에 해야 한다는 거다. 타 책을 먼저 참고하면 그 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먼저 생각하고 타 책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목차구성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시작할 수 없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또한 바꾸어야 하므로 완성도를 100으로 한다면 한 80정도까지만 작성하면 된다. 이 시점부터 본문을 쓰도록 하자. 쓰다보면 다른 생각도 들고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 때는 바꾸기도 하고 수정도 하면서 진행하면 된다. 나는 가급적 한 번 정해 놓은 목차는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생각이 다시 또 바뀌기도 하므로 즉흥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꾸준히 목차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초안대로 진행하는 편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이므로 원고를 쓰면서 편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목차잡기는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나도 책을 집어들 때 혹은 책을 읽기 전 목차부터 본다. 목차를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쓰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간혹 예상이 틀릴 때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목차를 보면 대략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목차를 보며 내용을 예상하다가 목차만 봐서 이해할 수 없는 꼭지는 먼저 읽어본다. 그러면서 느끼는 재미도 쏠쏠하다. 목차잡기는 전문가도 여전히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인만큼 어렵다고 고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나 어렵다. 하지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누구나 그럴듯한 목차를 잡을 수 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 <책쓰기가 만만해지는 과학자 책쓰기> (김욱 작가 저) 中 -